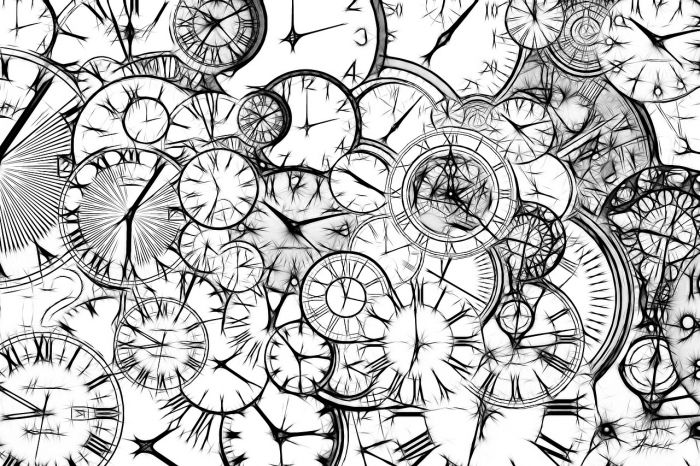(새 문서: 월간 문학공간에 제406회 신인문학상 당선된 작가이다. ==프로필== 170px|섬네일|김선희 파주 금촌 출생으로 파주문인협회...) |
(차이 없음)
|
2024년 9월 16일 (월) 16:17 판
월간 문학공간에 제406회 신인문학상 당선된 작가이다.
프로필
파주 금촌 출생으로 파주문인협회 회원으로 파주시 중앙도서관의 채록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내 도서관 및 교육청과 관련하여 독서지도 및 논술강사로서 20여년을 넘게 활동하고 1982년에 창립된 북티즌 독서토론회원 창립회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2022년 제32회 율곡문화제 율곡백일장에서 '자연 벽지다' 작품으로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작품 평가
시는 시인의 삶의 반영이며, 삶의 철학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시 를 읽는 독자는 시인의 삶의 미학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시의 언어적 미학을 더불어 느낄 때 그 시는 좋은 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어들이 차분하면서도 촘촘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아울러 시의 구성이나 흐름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우며 그 속에 서 서정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잘 드러난다. <문학공간 시부문 심사위원>
당선 소감
이제 시작이란 첫 마음으로 부지런히 생각을 닦으며 문학이란 로 나아가고 싶다. 나무숲에 잠복해 있다가 하늘과 마주한 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아주 작은 일을 시작할 거다. 바람으로 지를 색칠하고 먼 기억을 불러 수다스러움으로 색색의 보자기 맞출 거다. 그러면서 사람과 자연의 움직임을 가장 빨리 알아 림한 내가 시가 되고 싶다.
작품 소개
회화나무
동패동 언덕에는 회화나무가 사백오 십 년째 산다.
아득히 멀고도 가까운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
높다랗고 우람한 모습 앞에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6월의 핏빛 바람 자국
작은 잎사귀 옆옆이 세우며
사운거리는 입술엔 심학산 자락이
살짝 엿듣고
그랬노라 찬찬히 더듬는
하늘이 둘로 쪼개진 그 날의 기억
횃대에서 소리친 닭 울음소리에 묻혀버린
아버지와 삼촌의 넋두리
촘촘한 잎맥 그물 사이로
붉은 끈으로 묶인 사람들 이야기를
검은 먹과 붓질로
잠시도 쉬지 않고 옹이에 박나보다
가지마다 하얀 꽃잎을 폴폴 풀어내고
겹겹이 쌓인 아픔을 벌겋게 달굼질 하니
숲가에 잇닿은 어둑한 무게에 눌려
우듬지 하나 툭 떨어져 나간다.
때론 실개천처럼 눕고 싶었을
까무룩 지우고 싶은 마음 곤두서지만
추슬러 질곡의 소용돌이에 초록을 담가
닿소리 홀소리로 낱낱이 새긴 그 기록
나이테에 감은 채
화해의 오롯한 새길을
초연히 열어가고 있다
구두 수선공
비가 휘적거리며 내리는 오후
빨간 우체국 앞 구두수선집
그 낮은 문 열려있다.
등허리를 굽히고 간이역 의자처럼
쪽마루에 간신히 궁둥이를 붙이면
장인인 구두 수선공
활짝 미소 짓는다
앞부리가 다 까진
뒷굽마저 닳아빠진 구두 한 켤레
이리저리 살피다 히죽
구두 주인의 형편을 눈치챈 듯
어릴 적 앓은 소아마비
한쪽 허벅지는 가느다래
반대쪽 허벅지에 낡은 신를 대고
밤색 끌로 사알살 구두를 달랜다
창칼로 구두선 둥글게 맞추며
오로지 이 작은 이동 컨테이너 속
여여한 시각에 입맞춤하며
긴 날들을 보냈으리
주름진 입술도 합 모아 오그라든 것처럼
그가 지나다니던 나날들은
수선해야 할 손님 구두보다
더 낡아있지 않을까
홀까닥 속창과 겉창이 뒤집어지며
서로 걸어온 길을 수선하듯
굵게 솟아오른 푸른 힘줄
검붉게 튀어오르고
궁글려지는 손목
불끈 솟아오른다
딱 이틀 반 나절
-연밭에서-
흙투성이에 뿌리를 박고 잎부터 틔워
여름빛에 기대 넓은 초록을 펼친다
연분홍과 하양 꽃봉오리 하늘을 향해
뒤꿈치 살짝 들고 봉긋 올라선다
노랑 술 줄줄 달아대며 딱 이틀 반나절이 지나면
꽃잎을 한 겹 한 겹 벗어 내리다니
이내 송송 뚫린 연밥은 밤색 작은 알갱이 끌어안고
돌돌돌 작은 소리로 흔들어댄다
태생이 창공과 마주한 짧게 꽃피운 시간
허공속 작은 티끌도 헹궈내듯 스스로 스러져도
찰나의 순간들 너른 세상을 향해 상서로운 빛이 된
오묘한 속내를 가다듬게 한다
비록 짧은 생을 스치며 지나가지만
허허로운 벌판에 한순간의 꽃봉오리였던 기억
올곧게 올라서서 마주하던 바람결
연밭을 지나는 사람은 여름내 그 꽃이 그 연꽃인 줄 알겠지
이젠 오늘로 그만인
힐끗 보았던 초록 속 그 한 송이
아름다움 끌어안고 뚝 떨어진다
내일은 진흙 속에 또 다른 꽃잎이 피어나리
사라지는 골목길
지그재그 낮익은 길
일제히 뿜어져 나오는 연둣빛 사이로
사람 나간 허물어진 집에
봄이 들어앉았다.
한 때 살림살이 맷돌 빨래방망이 놔둔 채
댓돌 아래 공깃돌 뒹구는데
박태기나무 알알이 진분홍
꽃그늘 그림자 흔들어댄다
무겁고 아릿함 들춰내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처마 밑 겅중겅중 내리꽂히는 발걸음
저절로 어깨 수그리며 지날 때
지난 가을 푸르렀던 잎새 검게 물들고
검불에 걸린 낙엽 함께 뒹구는데
하얀 기억은 향내를 피우며 되살아난다.
복숭앗빛 손톱엔 어린 시절
꽃이 말하던 표정 그대로
나뭇잎이 재잘대며 들려주던 정다운 이야기
수런수런 고스란히 말개진다
다가오는 소란스러운 굴착기소리
낮선 작업 현장 차마 바라볼 용기
절레절레 고개 흔들며
검은 흙에 파묻고 싶다
아련한 기억
낡은 대문간에 놓아둔 채
쓰리도록 스산한 가슴 안고
자꾸만 뒤돌아보며 주춤주춤
빠져나온다
모과나무 아래서
잘게 쪼개진 낡은 햇살 사이로
고래등 기와지붕 위
우듬지 검게 상처난 연초록 모과
싱그러운 향도 품기 전 '쿵' 하고
떨어져 골짜기로 하염없이 굴렀지
밭고랑과 이랑 사이 벌러덩 드러누워
커다란 눈 껌뻑이는 못난이 열매
갈색빛 도는 아픈 곳 계절로 가리며
모공 속에서 진득진득 흘러나오는 슬픔만 매만진다.
울퉁불퉁 삐져나온 결 사이로
큼큼 시큼함은 저녁을 불러 모으고
돌 위에서 별을 부른 덩치큰 머슴
가을로 뻗친 황갈색을 소리 없이 끼얹는다
점점 서늘한 밤이 찾아오는 시간
나뭇등걸에 앉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던 비단 댕기 귀밑 머리
바위처럼 무거운 침묵의 계절도
끼룩거리는 흔들바람이 가뭇없이 데려갔지만
타향 땅 길 밖에 길에서 만나 돌아온
중절모 길상 서방님 옥비녀 쪽머리 아씨
나비꽂이 파르르 떠는 시간
황금빛 등불 주렁주렁 켜들고 있다.
- 모과는 박경리 소설 「토지」의 배경, 최참판댁
초침 소리, 잠깐
어제 태어나 어언 굵어진 나이테
깜빡하고 졸았더니 급행 버스로 데려다 주었다
차비도 치르지 않았는데
이 먼 곳까지 휘리릭
벚꽃 조용히 내려앉고
다음 선두주자 영산홍 붉은빛
겹겹이 둘러쌓은 회색 담장에
제 몸 기대지 않고 꼿꼿하게 피었다
어물쩍 봄빛 놓친 여행객 향해
아득히 머언 길 떠날 때
아무 준비 없이 휘적휘적 내쳐걸었던
그 단 한 사람 향해
조바심 내려놓고 머물길
많은 욕심 다 내동댕이치고
손끝에 닿았던 플라스틱 바가지만으로도
말랑한 가슴 가득차기를
두 손 모아 기다린다
초록빛 의자에 다가앉아
하얀 운동화 코끝으로 지그시
엄지발가락 누르며
어여 이어질 숨결 위에
흩어지는 선율 모아 귀 기울이고
미간의 행간 더듬으며
터벅터벅 남은 시간을 걷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