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쑤는 여자 – 강근숙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흔히들 죽 쒔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내 별명이 ‘죽 쑨 여자’가 되어 버렸다. 실제로 나는 죽을 잘 쑤기도 하고 먹는 것도 좋아 한다. 요즈음은 시중에 일회용 포장으로 나오는 것이 많아 힘들이지 않고 죽을 먹을 수 있지만, 맛과 향은 직접 만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곡식이 귀하던 시절 적은 양으로 배를 채우는 데는 죽만 한 것이 없었다. 쌀 한 양재기 불려서 된장 조금 풀고 야채죽을 끓이면 여덟 식구가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모자라는 찬밥도 김치를 숭숭 썰어 넣고 김치죽을 끓이면 한 끼 때우기에 넉넉했다. 지금은 늘려 먹으려고 죽을 쑤는 게 아니라 맛과 영양으로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뷔페에 가면 그 많은 음식 중에 죽 그릇에 먼저 손이 간다.
오늘은 입맛이 없어 아욱죽을 끓였다. 부드럽고 구수한 죽 한 그릇을 먹고 나니 보약이라도 먹은 듯 속이 뜨뜻하고 편안하다. 나는 이렇듯 죽을 좋아한다. 이가 튼튼치 못해 무른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죽이라면 어떤 것이든 즐겨 먹는다. 그중에 호박죽을 제일 즐기는 편이라 가을이면 늙은 호박을 여러 개 얻어다 놓는다. 생각날 때마다 죽을 쑤려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었는데도 군데군데 상하고 말았다. 버리기가 아까워 성한 데를 발라서 죽을 쒔는데 제철이 아니라 그런지 맛이 덜했다.
가을이면 호박죽 쑤는 일을 연례행사처럼 하던 때가 있었다. 두꺼운 껍데기를 벗기고 팥과 함께 삶다가 나중에 찹쌀가루를 버무려 넣고 한소끔 더 끓여낸다. 그것이 별식이나 되는 것처럼 언제나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찬대로 호박죽은 참으로 맛이 각별하다. 어디 호박죽뿐인가. 계절마다 제철 곡식이나 채소를 넣고 묽게 끓인 죽은 맛도 있고 영양가도 많아 밥을 먹을 수 없는 노약자나 입맛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최고의 음식이다.
어찌하여 내게 ‘죽 쑨 여자’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내 귓가에서 죽 쑨 여자라는 말이 떠나지 않는다. 죽을 좋아하고 죽을 잘 쑤는 여자라고 붙인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삶을 죽 쑤듯이 살아왔다고 하는 말같이 들리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나는 정말 죽 쑤는 여자인지 모른다. 지난 세월 무던히도 애쓰며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허물투성이 죽 쑨 인생이었다. 어느 누가 세상을 죽 쑤듯이 살고 싶으랴마는 사는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어찌 하겠는가.
이웃에 사는 이가 농사지은 거라며 늙은 호박 하나를 가져왔다. 호박답지 않게 모양이 괜찮아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았다.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지만, 어느 바람 부는 날 그것을 내려 죽을 쑬 것이다. 인생의 죽을 쑤는 여자가 아니라 이웃과 따뜻함을 나눌 죽을 쑤는 ‘죽 쑨 여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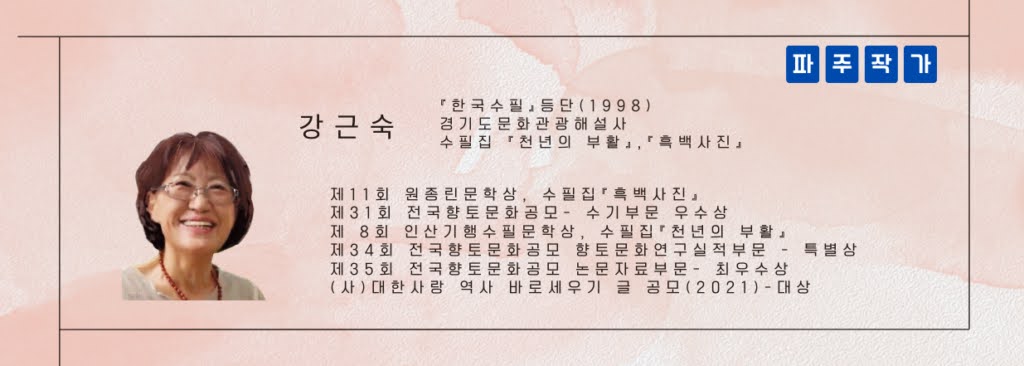





매사 효율과 결과만 따지며 살았는데, 시간을 들여 푹 끓여낸 죽의 미학을 배웁니다. 가끔은 인생도 조금 죽을 쑤면 어떤가요. 그만큼 부드러워질 테니까요. 잘 읽었습니다.